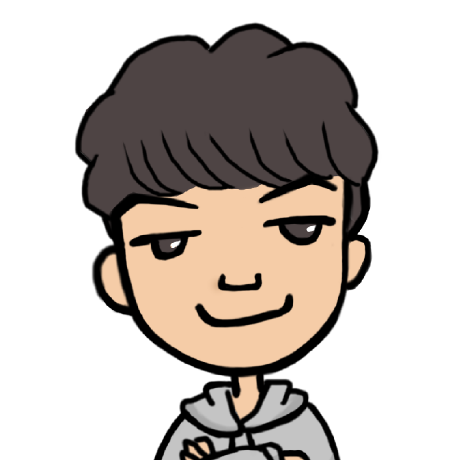《더 서브스턴스 (The Substance, 2024)》은 프랑스·영국·미국 합작의 바디 호러 영화로, 코랄리 파르자(Coralie Fargeat)가 각본, 연출, 편집 등 다중 역할을 수행했다.
공개일은 칸 영화제 초청작으로 5월 19일이며, 미국·영국 등에서는 9월 20일 개봉했다.
줄거리는 한때 전성기를 누렸던 방송 인물 엘리자베스 스파클(데미 무어)이 나이가 들어 방송에서 퇴출당한 뒤, 비밀 약물 “The Substance”를 사용해 젊은 자신(Sue, 마거릿 퀄리)을 생성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이 리뷰에서는 줄거리 요약, 인물·연출 분석, 메시지 해석, 개인적 느낀점, 관람 팁 순서로 정리할게.
줄거리 요약 — 두 자아의 충돌, 아름다움과 존재의 위기
영화는 엘리자베스 스파클이 한때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피트니스 쇼의 스타였지만, 50세가 되며 시청률과 이미지에서 밀려난 상태로 시작된다.
방송국과 프로듀서는 그녀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퇴출을 결정하며,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잊혀지는 존재라는 위기에 직면한다.
절망 속에서 그녀는 불법약물 “The Substance”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것이 자신의 신체 일부에서 젊은 버전의 자신을 생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젊은 자아, Sue(마거릿 퀄리 분)는 겉보기엔 이상적이며 대중의 환호를 받는다. 그러나 엘리자베스가 일정 주기로 다시 복귀해야 한다는 조건이 존재하고, 두 자아 간의 갈등이 점점 격화된다.
Sue는 점차 자신이 독립적인 존재가 되려 하고, 엘리자베스는 그에 맞서 자신의 정체성과 기억을 지키려 한다.
영화는 충격적이고 잔혹한 신체 변형 장면들을 통해 두 자아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들을 과장되게 보여 주며,
관객은 무엇이 원본이고 복제인지, 기억이 진짜인지 혼란 속으로 빠져든다.
변환과 혼종이 반복되는 클라이맥스에서는 두 자아가 독립 경쟁 구도로 섞이고, 약물의 부작용이 극한을 드러낸다.
결말부에서는 명확한 해답 대신 잔혹한 상징과 이미지, 그리고 열린 끝맺음을 선택한다.
인물·연출 분석 — 자아 분열과 시선의 폭력, 과장된 시각 언어
이 작품의 중심은 엘리자베스와 Sue, 두 자아가 한 몸을 공유하면서도 경쟁하는 구도다.
데미 무어는 엘리자베스라는 ‘과거 스타’의 초조함과 절망, 자기 파괴 충동을 과장된 표정과 몸짓으로 구현한다.
마거릿 퀄리는 Sue의 밝고 유혹적인 연기 톤으로 두 자아 사이의 대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며,
청춘과 생동감이란 이미지를 소유한 존재로서의 매력을 발산한다.
그 외 조연으로는 데니스 퀘이드가 Harvey 역으로 등장하며, 미디어 권력자이자 약물 상업화의 축을 담당한다.
연출 스타일은 매우 과장되고 과도하다. 시각적으로는 붉은 톤, 혈관 이미지, 액체 분출, 육체적 왜곡 표현 등이 강조된다.
The Substance는 바디 호러 장르 특성을 극대화한 영화로,
시각과 촉각을 자극하는 장면들이 반복돼 관객에게 충격을 남기려 한다.
편집은 강한 대비와 점프 컷, 잔상 효과 등을 사용하며, 리듬이 일정치 않아 때론 혼란을 유도한다.
비평가 모니카 카스티요는 이 작품이 “정의에 찬 시각적 분노와 유머 감각을 동시에 지닌다”라고 평했다.
그러나 일부 비평은 플롯의 과잉, 메시지의 과장됨, 감정적 몰입 부족을 지적한다.
결국 이 영화는 스타일이 메시지를 압도하는 순간들이 있으며,
그 과잉과 미완성의 경계에서 미완의 통찰을 던지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메시지 해석 — 나이와 젊음, 미디어 권력과 자아 존중의 갈등
첫 번째 메시지는 나이와 젊음의 존재 압박이다.
영화는 여성 스타가 나이가 듦에 따라 가치가 사라지는 미디어 시스템을 정면 비판한다.
엘리자베스는 유리 천장에 부딪힌 존재로, 자신의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젊음을 갈망하게 된다.
Sue는 바로 그 갈망이 실체화된 존재로,
젊음의 욕망이 얼마나 위험한 동력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두 번째 메시지는 권력과 미디어의 폭력이다.
Harvey 같은 권력자는 외모 중심 문화와 대중 통제 전략을 이용해 사람들을 소비하고,
여성의 몸을 제작하고 소비하는 기제로서 미디어를 드러낸다.
세 번째 메시지는 자기 파괴와 재생의 경계이다.
엘리자베스와 Sue가 서로 경쟁하면서 파괴적 경로와 재생의 경로가 뒤섞인다.
자기 수용과 정체성 회복은 폭력과 변형의 과정을 거치며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마지막 메시지는 몸의 정치학이다.
영화는 바디 호러라는 유형을 통해 여성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통제를 폭로하고,
관객이 불편함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감수성과 저항의 공간을 연다.
이 작품은 단순한 충격 체험을 넘어서,
존재와 외모, 욕망과 진실이 뒤얽힌 복합적 메시지를 던진다.
개인적 느낀점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내 안의 두 얼굴이 충돌할 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계속 맴돌았다.
과장된 이미지와 폭력적 시각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이 작품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임을 느꼈다.
'일상 > 영화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야와 마녀 Earwig and the Witch 리뷰 · 스튜디오 지브리의 새로운 실험 (1) | 2025.10.06 |
|---|---|
| 라이온 킹 The Lion King 라이브 액션 리뷰 · 고향과 운명의 귀환 (0) | 2025.10.06 |
| 아웃백으로! Back to the Outback 리뷰 · 탈출과 편견의 여정 (0) | 2025.10.05 |
| 이별에필요한 Lost in Starlight 줄거리 리뷰 · 우주 너머의 사랑과 연결 (1) | 2025.10.04 |
| 엔칸토 Encanto 줄거리 리뷰 · 가족과 기적의 화해 (0) | 2025.10.04 |